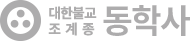‘오늘도 부처님 됩시다! 화안시(和顔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7.31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오늘도 부처님 됩시다! 화안시(和顔施)!’
치문반 수경
이번 여름철 차례설법에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화안시(和顔施)’입니다.
이 문장이 익숙하시지요? 저희 치문반도 강사 스님과 함께하는 수업을 마치고 늘 이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지난 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어보려 애썼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화안시’는 제게 꼭 맞는 설법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제로 설법을 준비하면서 “나는 진심으로 화안시를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안시는 무재칠시, 곧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안의 괴로움에 갇혀 누구를 돌아볼 틈도 없었고,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우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보시라는 말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보시를 외면하고 회피하던 그때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닫혀 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부처님 법을 만나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가 전 저는 약 1년 반 동안 혼자 마음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작은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이었습니다. 이 인연을 따라 정토회의 불교대학, 경전대학, 깨달음의 장을 거쳐 일반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전법과 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의 수행’이 아닌, 남을 위한 수행의 가치를 체험했습니다.
정토회는 대부분 재가자 중심의 공동체로, 불교대학과 경전대학 역시 100% 전법회원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단 한 푼의 보시금도 받지 않고, 매주 리허설과 회의, 교육까지 병행하는 그분들의 헌신을 보며, 보시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 정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잡보장경》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동안 네가 베풀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풀고 싶어도 줄 게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런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일곱 가지나 있다.”
그것이 바로 무재칠시입니다:
1. 안시(眼施) –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기. 자비로운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랑과 위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2. 화안시(和顔施) – 부드러운 얼굴, 미소 짓기. 말없이 전하는 미소도 큰 보시입니다. 제가 동학사에서 평안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도, 선배 스님들의 따뜻한 미소 때문일 것입니다.
3. 언시(言施) – 좋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말도 보시입니다.
4. 심시(心施) – 마음을 내어주는 것. 마음이 닫혀 있다면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5. 신시(身施) – 몸으로 돕는 것. 짐을 들어주거나 도와주는 작은 행동도 보시입니다.
6. 좌시(座施) – 자리를 양보하는 것. 존경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7. 방사시(房舍施) – 공간을 내어주는 것. 작은 배려가 큰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과경》에는 “다른 이의 보시를 보고 기뻐하고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는다”는 수희찬탄(隨喜讚歎)의 보시도 나옵니다.
불법을 배우며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얼굴,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결국 물질보다 마음과 태도의 실천이며, 수행자의 일상 속에서 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철을 시작하며 저는 ‘화안시의 실천을 잘 마무리한 의미로 이 설법을 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법을 준비하며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화안시를 실천하며 강원 생활을 해왔는가?” 이 물음 앞에서 저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 철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선배 스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배움으로 다가왔고, 그 감사함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힘들어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철이 거듭될수록 환경에 익숙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질수록 제 안의 익숙한 마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미소를 짓는 일이 점점 쉽지 않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피곤함과 조급함, 분별심이 일어났고, 제 표정도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안시를 주제로 삼아 놓고도, 오히려 그 실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철을 시작할 때는 “이번 철을 잘 마무리하고 화안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해보자”는 마음이었지만, 실제로 체감한 것은 ‘미소 하나 짓는 일’조차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든 날일수록, 오히려 의식적으로 웃어보려 애쓰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웃음이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을 때, 혹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상대에게 밝은 얼굴을 내어주었을 때, 그 짧은 교감 속에서 저는 다시 힘을 얻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저는 미소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웃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내 안의 괴로움을 흘려보내는 수단이 되었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분별망상도 가볍게 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한 걸음 더 수행자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선 저는, ‘화안시를 잘 실천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안시를 주제로 삼고 나서야, 그 부족함을 더 선명히 바라보게 된’ 평범한 수행자일 뿐입니다.
웃는 얼굴 하나에도 자비와 깨어있음이 필요함을, 지금 저는 진심으로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화안시는 앞으로도 제가 오래도록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수행의 주제일 것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가벼운 미소지만, 그 안에는 내려놓음과 참회, 그리고 상대를 향한 열린 마음이 담겨 있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법이 어떤 성과의 보고라기보다는, 저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바라보며, 다시 한 걸음 수행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은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발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됩시다!
화! 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