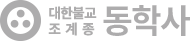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숨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7.31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숨보기
사집반 혜념
왜 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 외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하루 중에 얼마나 될까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가능은 한 걸까요? 우리는 왜 괴로운 걸까요?
괴로움의 원인
바로 탐냄, 성냄,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현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몸과 마음이 단지 오온의 결합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온뿐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잘못 앎으로써 세상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되고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대로 바라는 것이 탐욕이고, 탐욕대로 되지 않을 때 싫어함이 성냄입니다. 이렇게 무명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족, 성냄, 슬픔이 일어납니다.
2.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계발하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지혜를 계발하는 수행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쉴 세 없이 정신없이 떠도는 마음으로는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합니다. ‘붓다의 호흡법’으로 알려진 숨에 마음챙김하기, ‘아나(들숨)빠나(날숨)사띠(마음챙김)’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시키는 수행이며 부처님 스스로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수행방법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라는 명상주제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상주제 중에서 가장 으뜸이며, 몇몇 벽지불과 부처님들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되고, 이 명상주제로 특별함을 얻은 자들이 금생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3. 숨보기 방법
1)숨의 특징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한 곳에 가서 그 대상을 거머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우울해 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가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숨은 우리가 태어나 ‘응애’를 외치면서 부터 마지막 숨을 들이쉰 후 내뱉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대상이며,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들뜨게 하지 않는 중립적인 대상입니다. 다른 감각적 대상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알기 어렵지만 아무리 함께해도 어떠한 위험도 없는 최고의 명상 대상입니다.
2) 숨을 보는 장소
태어나서 계속 숨을 쉬었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떻게 숨이 날고 드는 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맛지마니까야 118번경,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에서 ‘전면(全面)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면은 ‘빠리무캉’. ‘빠리’는 둘레, ‘무캉’은 입, 얼굴, 출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around the mouth’ 입 주위를 말하고 있고, 주석서에서는 구체적으로 ‘at the tip of the nose or at the center of the upper lip’ 즉 숨이 닫는 곳 인중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에 마음챙김 하는 것입니다.
3) 숨을 보는 방법
a. 마음을 가라 앉히고 늘 하던데로 자연호흡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쉬던 숨을 사띠(대상을 향한 마음챙김) 없이 쉬었다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관심을 갖고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숨 자체를 고요히 단지 아는 것입니다. 관여하거나 조절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숨을 아는 것입니다. 인중을 지나가는 숨을 그저 알 뿐입니다.
b. 몸의 불편함이나 불유쾌함이 일어날 때 그런 느낌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꾸 관심을 가지면 숨에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다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숨에 집중할 수 없다면 숨을 알면서 자세를 바꾸어도 됩니다.
c. 숨을 따라다니지 않기입니다. 청정도론에 문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성안으로 들고 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관심 갖지 않고 가는 곳을 따라 가지 않듯이,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볼 뿐이지 문이나 서 있는 장소에 집착하지 않듯이, 오직 인중 부위의 들고 나는 숨에만 집중합니다.
d. 일어나는 망상에 관심 갖지 않기입니다. ‘아..어찌해서 오늘 천진불스님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입승스님은 왜 또 그러시지? 억울하네..’등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런 마음이 올라 온 것을 알고 단지 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이 그리고 쉬지 않고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망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속도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망상이 심해서 숨에 집중할 수 없다면 ‘들숨, 날숨’이라고 인식하거나 수식관을 합니다.
e. 졸음이 와서 잠을 깨려 하거나 누가 지나가거나 심하게 망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자하는 갈망이 대단해서 눈을 뜨면 집중력이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분이나 1시간을 숨을 보겠다 결정했다면 그 시간 만큼은 눈을 뜨지 않으리라는 결정심을 일으킵니다.
f.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15분 아침, 저녁으로 숨을 보리라 계획했다면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속적으로 보다보면 15분에서 30분으로 또는 1시간으로 숨 보는 시간을 늘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숨보기의 이익
제가 숨보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일으킨 분노를 이겨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겨내지 못해서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다시는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킨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몸과 마음은 대단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그 두 번째 화살을 적극적으로 쥐고 저 자신을 마구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숨을 알고 보면 볼수록 그 속에서 생겨나는 고요함을 통해 조금씩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이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지 상대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가던 일으킨 분노가 일주일로 하루로 때로는 그 즉시 부끄러워하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의 지혜의 칼이 그리 날카롭지 못해서 모든 일으킨 분노의 번뇌를 단칼에 잘라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숨보기를 하기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혜념스님은 행복한가?’라고 묻는다면 ‘넵’하고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 명상주제를 향한 끊임없는 마음챙김만이 열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숨에 마음챙김 하기, 아나빠나사띠를 수행함으로써 열반에 이르는 행복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덕회향 하시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갈애, 생애에 대한 집착, 사견, 무지등의 번뇌로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오늘 하루 수행하고, 계를 지키며, 보시하고, 법문을 설하고 들은 저의 이 공덕을 공평히 나누어 드립니다. 이 공덕이 탐,진,치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선정과 열반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