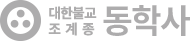여성의 몸으로 붓다를 이룬 사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5.07.31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여성의 몸으로 붓다를 이룬 사람
사교반 지명
지난 봄방학 때 동학사에서 소임을 살면서 『법구경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느낀 점은 연기의 철저함, 서원의 중요성, 삶은 한바탕 꿈일 뿐이고 윤회의 삶을 멈추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법구경 이야기 중,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빠따짜라 비구니 이야기를 소개하고 서원과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빠따짜라는 사왓띠의 부유한 상인의 딸로 성장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7층의 높은 방에 하인을 두고 감시합니다. 그러나 빠따짜라는 하인과 눈이 맞아 멀리 집을 떠나 그 곳에서 아이를 가졌고,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집을 나섰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가졌고 출산일이 다가오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폭우를 만났는데. 그때 빠따짜라는 산통을 겪게 됩니다. 남편은 비를 막으려고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습니다. 빠따짜라는 번개와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날이 밝자 남편을 찾다가 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폭우로 강물이 불어 두 아이를 데리고 한꺼번에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둘째 아이를 안고 강물을 건너 언덕 위에 두고 큰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강의 중간쯤 갔을 때 독수리가 둘째 아이를 날쌔게 채 갔습니다. 빠따짜라는 독수리를 쫓기 위해 큰소리를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큰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 줄 알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친정집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 친정집 소식을 물어봅니다. 지난밤 폭우로 인해 친정집이 무너져 부모님과 친정 오빠가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빠따짜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었고요. 한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 버렸고
다른 아이는 독수리 가 채 가버렸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는 집이 무너져 죽었어요.”
빠따짜라는 거리를 떠돌다가 기원정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빠따짜라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십만겁 동안 바라밀을 닦았으며 서원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빠따짜라는 부처님 앞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빠따짜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맞다. 너의 말과 같이 너의 남편, 두 아들, 부모님과, 오빠는 죽었다.
여인이여! 이제 멈추어라. 너의 의지처는 어디에도 없다. 그
대가 끝없이 윤회하면서 부모, 자식, 형제를 잃고서 흘린 눈물은
저 사대양의 물보다 더 많단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주제로 법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하시자 그녀는 점점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빠따짜라여, 저 세상으로 갈 때는 부모 자식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피난처,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 하물며 금생에 어떻게 그들이 피난처, 의지처가 되겠느냐?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영원한 의지처를 찾아 열반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아들도 지켜줄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지켜 줄 수 없다.
죽음이 닥친 이를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아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잘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빨리 닦아야 한다. (법구경 288~289)
이 법문 끝에 빠따짜라는 수다원과를 성취하고 부처님께 출가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물항아리에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로 물을 부었더니 물은 조금 흘러가더니 땅 쏙으로 스며들어버렸고, 두 번째로 물을 부었더니 좀 더 흘러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번째에는 좀 더 멀리 가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이 세 가지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숙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은 물은 약간 흘러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중생들은 어린 나이에 죽는다. 내가 두 번째로 부은 물은 좀 더 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꽃다운 나이에 죽는다. 내가 세 번째로 부은 물은 좀 더 멀리 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나이가 들면 죽는다.’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서 빠따짜라의 이러한 변화를 아시고 광명의 모습을 나투시어 그녀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게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법구경 113)
이 게송 끝에 빠따짜라는 사무애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머무르고(무주상), 항복 받아야 할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일체법 무아)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구게로 말씀하십니다.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 모든 유위법(有爲法)은 꿈, 환상(幻),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풀끝의 이슬, 번갯불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觀)할지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상(無相) 고(苦), 무아(無我)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행복을 찾으면 반대인 불행도 같이 찾아오나니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은 법구경 이야기와 금강경에서 공통으로 무상, 고, 무아의 실체를 알아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여 윤회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빠두뭇따라 부처님 시절에 빠두뭇따라 부처님은 남방불교 팔리어 경전에서 과거 7불설, 25불설, 29불설 등이 있는데 25불설에는 10번째 과거부처님으로, 29불설에는 13번째 과거 부처님의 빨리어 이름입니다.
빠따짜라는 부처님께서 한 비구니에게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중에서 제일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결심하고 이렇게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도 저 비구니 스님처럼 미래 부처님 아래에서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중에서
제일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빠두뭇따라 부처님께서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시고서 그녀의 서원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아시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이 여인은 빠따짜라라는 이름으로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가운데 제일이 될 것이다.”
빠따짜라는 서원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비구니 가운데 지계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 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설법으로 수행을 잘 이끌어줍니다. 경전 속 아라한들은 서원을 세우고 다생겁래 동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을 이룬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비구 중 안냐꼰단냐는 최초로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고 사리불은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만 보고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이 4대양보다 더 많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과 기억으로 살 뿐, 윤회의 삶을 멈출 줄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보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바른 서원을 세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른 서원으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할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